미야자키 이치사다, 『중국중세사』
미야쟈키 이치사다, 『중국중세사』, 임중혁 · 박선희 옮김 (서울: 신서원, 1996), 355쪽, 10,000원.
宮崎市定, 『世界の歴史7: 大唐帝国』 (東京: 河出文庫, 1989), 439頁, ¥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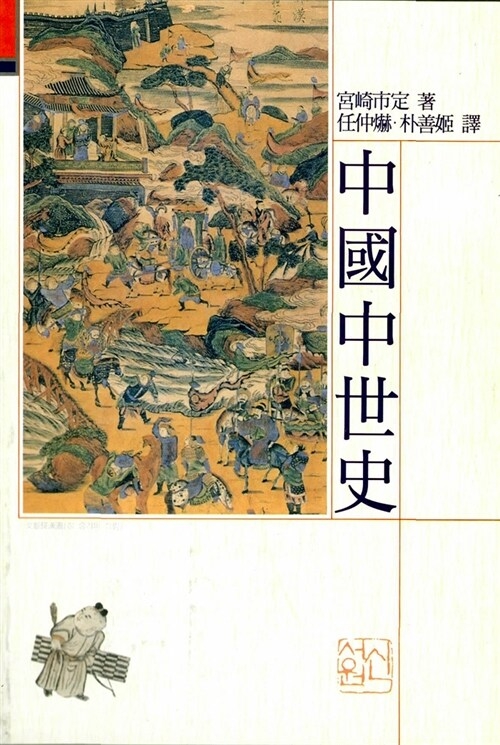
『대당제국(大唐帝国)』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서는 (일본 원제), 막상 실제로 당의 역사에 대한 분량은 책 전체의 1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야자키 이치사다 선생은 “종래의 역사가들은 걸핏하면 당으로써 당을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것으로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당 성립 이전의 오호남북조로써 당의 본질을 말하는 필법을 썼는데, 그 결과 목표인 당왕조 자체의 설명은 매우 소략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대당제국이 대당제국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필법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7쪽)고 설명했다.
물론, 이 책의 “서술범위는 740년에 걸친, 나이토 고난 박사 이래 쿄토학파가 말한 바의 중국 중세에 해당된다. 다만 일본에서는 따로 송대 이후를 중세로 하는 설도 한 편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대단한 오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중세사 가운데서도 가장 인구에 회자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당왕조를 뽑아내어 이것으로 전체를 대표시키는 것으로 했다”(5쪽)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교토학파의 시각이 일본학계 전체를 대표하는 시각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어판의 제목 『중국중세사』는 책 전반의 내용에는 아주 적절한 번역이었지만, 재미는 조금 덜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번역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역자서문에 따르면 미야자키 선생의 글은 “대학자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용이 소략하였다. [중략] 박식한 학자가 이렇게 글을 쉽게 쓰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3쪽) 한국어판을 읽을때 내가 느낀 바도 비슷한데, 그만큼 번역이 잘 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얼마전에 읽은 이근명 교수님의 『왕안석 평전』도 그렇고, 진정한 대가의 글쓰기는 다 그런 것인가 보다. 여하튼, 위진남북조는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인지, 다른 책들을 보면 정신없이 전개되는 이야기에 길을 잃기 쉬운데, 미야자키 선생의 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책을 읽으면서 미야자키 선생의 서술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띄었다. 첫번째는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을 거침없이 비교하는 서술이었다. 그는 이전의 중국사 연구가 중국의 특수한 면만을 강조했지만, “특수성이라 할 때는 반드시 그 바탕에 공통성이 예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실은 동서양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놀랄 정도의 유사성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15쪽)고 지적했다. 그런 예가 곧장 이어지는 고대 중국의 모습이다. 고대 중국이 그리스 · 로마 세계와 마찬가지로 무수한 도시국가의 집합체였고, 그 독자성과 자치 정신은 중국이 통일되어 대제국으로 되고,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읍으로 되고 나서도 오래도록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 제국의 중앙집권정책이 점차 강화되면서 지방자치체가 차츰 자치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로마 제국에서도 얼마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다. (18-19쪽)
책의 또다른 특징은, 미야자키 이치사다 선생 자신이 ‘수량사관(數量史觀)’이라고 이름 붙인 시각이다. 그는 경기순환 개념을 중국사에 대입했다. 그에 따르면 고대는 경기가 상승하는, 그 주기가 무한대였다. 반면 한나라가 멸망하면서 시작된 중세는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여, 그 주기의 유한함이 시작된 시기이다. 근세는 유한한 경기순환의 주기가 더욱 짧아져가는 시기이다. (350-53쪽) 앞서 적었듯, 미야자키 선생은 “당 성립 이전의 오호남북조로써 당의 본질을 말하는 필법”을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수량사관이라는 관점으로써 당이 왜 중세인가를 말하는 필법”을 썼다고 해도 좋지 않을까.
미야자키 선생의 위 서술이 역사 연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경제사가 명백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분야라고 보지 않는다. 예컨데 경제사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연구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의 연구를 보자.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혁명을 혁명이라고 불러야하는지에 관한 용어 선택의 문제에서부터, 거시적 지표에 근거한 성장의 문제, 산업혁명의 결과 사람들의 생활수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든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조엘 모키어(Joel Mokyr) 선생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논쟁들을 소개하며 “명백한 답을 원하는 사람은 경제사연구에 감히 나서지 말아야 한다 (Those who sekk definitive answers should not venture into economic history)”고 적기까지 하였다. (Mokyr 1985: 2; 이 문제에 대한 한국어 연구로는 노택선 2005: 3-28 참고) 양과 질, 모든 부분에서 중국중세에 비해 훨씬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영국의 산업혁명마저 이럴 정도인데, 중국중세는 어떻겠는가.
그러나, 수량사관에 대한 이야기는 사소한 투덜거림이고, 『중국중세사』라는 책의 탁월한 성취를 부정하고자 적은 이야기는 아니다. 후한 멸망부터 송의 성립까지, 길고, 혼란스러운 시대의 다양한 면모를 이정도로 쉽게, 적어야만 할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분량의 부담은 크지 않게 적는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몇년 전부터 이야기를 장황하고 실속없이 적고 있지 않나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반성하게 된다. 앞으로도 미야자키 선생의 책을 틈틈히 찾아보면서 더 배워야 겠다.
*
Mokyr, Joel. 1985.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New Economic History”, in ed. Joel Mokyr, The Economic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Rowman and Allanheld, pp. 1-52.
노택선. 2005. 『전쟁, 산업혁명 그리고 경제성장』,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