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틴 래디,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 박수철 옮김 (서울: 까치, 2022), 580쪽, 30,000원.
Martyn Rady, The Habsburgs : the rise and fall of a world power (London: Allen Lane, 2020), xvii+397 pp., £30.
- 저자
- 마틴 래디
- 출판
- 까치
- 출판일
- 2022.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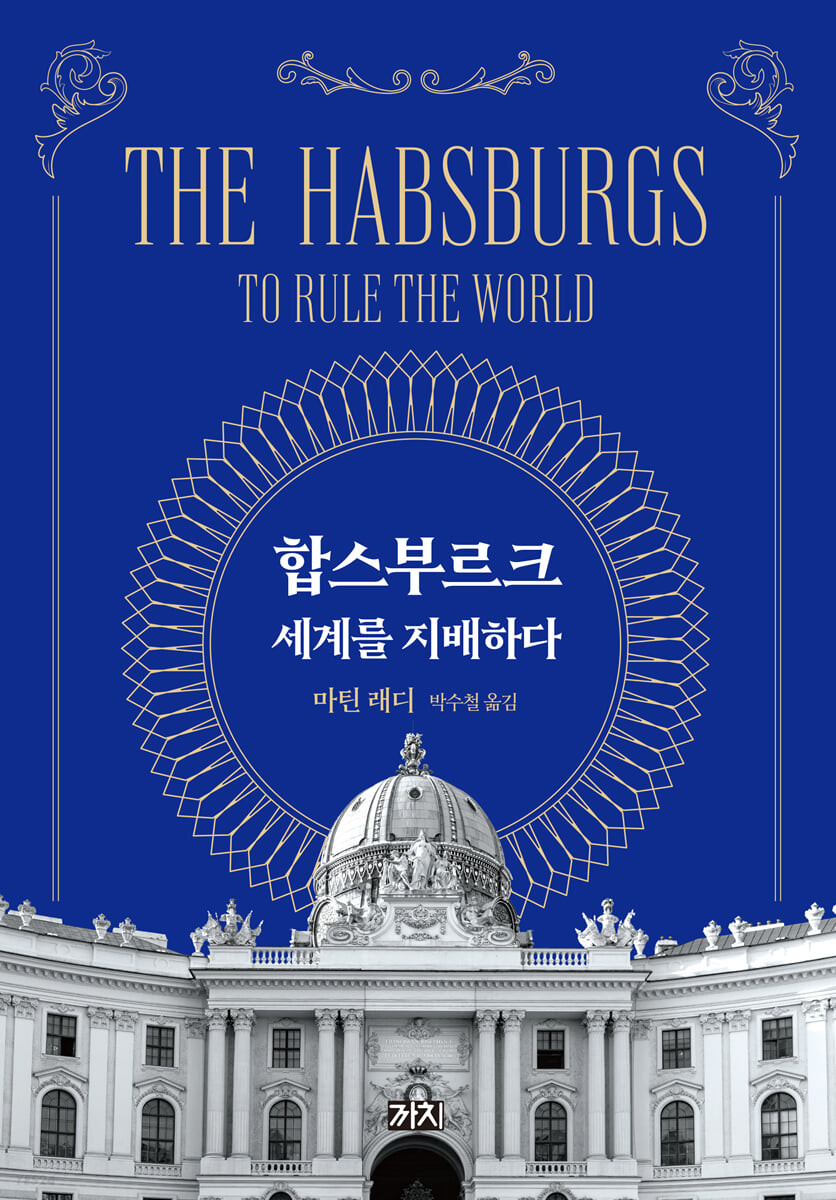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출판계라지만, 최근 몇년 동안 한국인 학자의 저술과 외국 학자의 번역서를 막론하고 그간 합당한 주목을 받지 못한 역사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직접 적은 개설서가 잇달아 출간되고 있는 경향만큼은 응원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 소개한 책들만 꼽아보아도, 이근명 교수님의 『왕안석 평전』, 카렌 라드너 선생님의 『바빌론의 역사』, 피터 골든 교수님의 『중앙아시아사』, 이주엽 선생님의 《몽골제국의 후예들》, 찰스 핼퍼린 선생님의 《킵차크 칸국》 등이 있다.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오가사와라 히로유키 선생님의 ⟪오스만 제국⟫이나 크리스토퍼 클라크 선생님의 ⟪강철왕국 프로이센⟫도 빠뜨리긴 아쉽다.
이번에 소개할 책인 마틴 래디 선생님의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도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반갑다. 간략히 찾아본 바로는 카를 5세 시대 합스부르크조와 중세 헝가리 및 루마니아 등을 폭넓게 연구한 학자인 것 같았다. 특히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 이전에는 옥스포드대학교 출판사 A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의 The Habsburg Empire (2017)를 저술하기도 했는데, 학자로서의 자질과 글쓰는 능력을 겸비한 증거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다. (A 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는 한국에 고유서가 출판사의 ‘첫단추’ 시리즈로 소개되고 있는데, The Habsburg Empire도 소개되길 기대한다) 실제로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존재해온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닌 복잡다단한 측면을 주어진 분량 내에서 최대한 잘 조망해주었다.
역사서에서 교훈을 꼭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사실 안 좋아한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보편성’에 대한 강조는 요즘이라 오히려 한번 고민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민족 집단은 유대인과 보스니아계 이슬람교도들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꽤 흥미로운 부분이다 (485쪽). 물론 악화되어 가는 중앙 유럽의 정치 상황에 대해 “합스부르크 가문 통치자였다면 더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516쪽)는 저자의 평가는 과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아닌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래디 선생님 자신도 합스부르크 가문이 “제국을 이루는 여러 민족의 복리에 전념한 통치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얼간이들과 몽상가들”(515쪽)도 내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나. 어쨋든 여러 민족 공동체를 재료로 단 하나의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합스부르크조의 역사는 중요한 참고문헌 중에 하나에 꼭 포함되야할 부분이라는 지은이의 시각에는 동의한다.
다만 합스부르크조에 대해 저자가 좋게만 적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하고 있고, 때로는 그걸 넘는 신랄한 표현도 있는게 이 책의 장점이다. 450쪽에서 합스부르크 가문을 중심으로 여러 민족 집단에 통일성을 부여해 결속시키려는 시도로 이루어진 백과사전 편찬의 결과물에 대해 “통치자에 대한 천박한 찬사가 곁들여졌다”는 저자의 평가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437-38쪽에서는 이제는 왕가가 최초의 근대적 유명 인사(modern celebrity)로 변화했던 모습이 그려지는데 (과거는 아니였는가 하는 문제는 제쳐두고) 오늘날 왕가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합스부르크 왕조에 가지고 있었던 오해도 책을 통해 몇 가지 풀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크루세이더 킹즈 2를 하던 시절 바벤베르크 가문이 합스부르크조의 기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14세기 합스부르크 가문의 날조에 의해 만들어진 사실이었다 (68쪽). 시시의 정치적 수완과 능력에 대한 지은이의 고평가도 상당히 흥미로웠다 (420-23쪽). 같은 맥락에서 래디 선생님은 프란츠 요제프가 성실하지만 지배자로서의 자질은 크게 부족한 인물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406-07쪽,411-13쪽, 414-16쪽, 418쪽). 가끔 프란츠 요제프에 대해 적은 인터넷 글들을 보면 프란츠 요제프가 맞이한 몇몇 비극들 때문에 그의 능력을 올려치기 한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걸 교정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은이는 513쪽에서 “로마노프 가문의 전제적 제국은 러시아적 정체성을 띠었고, 19세기 말엽의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점점 터키인화되었지만, 중앙 유럽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민족 정체성을 초월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나, 도널드 쿼터트 선생님이 지적하였듯, 1908년 이후에 집권한 청년 튀르크를 포함하여 오스만 국가 엘리트들은 오스만주의에 충실한 편이었다. 1908년 이후 몇몇 지도자들이 개인적으로 튀르크인으로서의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했고, 다른 족류(族類)에 비해 튀르크인이 우월하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과 그들이 속한 정당은 오스만주의와 범이슬람주의라는 제국의 정책을 옹호하고 촉진하는 것을 계속했다. 합스부르크 정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08년 이후 오스만 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은 튀르크 민족주의보다는 철저한 통제와 일률적인 제국의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반영했다. [도널드 쿼터트, ⟪오스만 제국사: 적응과 변화의 긴 여정, 1700~1922⟫, 이은정 옮김(파주: 사계절, 2008), 291-92쪽]

번역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자잘하게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66-67쪽에는 “과거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섭정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슈바벤의 영지 덕분에 총독을 임명할 수 있었다”는 문장이 있는데, 이는 “과거에 합스부르크 가문은 섭정을 통해 오스트리아를 다스렸지만, 이제 총독이 임명되는 쪽은 슈바벤의 영지였다(Whereas in the past, the Habsburgs had administered Austria through regents, it was now their Swabian possessions that had governors appointed to them)”로 고쳐야 한다. 428쪽과 434쪽에는 “미국 독립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원서에서는 “미국 내전(American Civil War: 미국 남북전쟁)”이라 적혀있었다. 까치 출판사의 편집이야, 학술서 출판에 나름 전통이 있는 곳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디자인 기조는 전보다는 화려하고 세련되게 바뀐 점도 장점이다. 다만 87쪽의 “bĭénnĭum”은 잘 쓰이지 않는 문자들이 섞여서 그런지 몇몇 글자의 글꼴이 깨진게 아쉬웠다(사실 원서에는 그냥 “biennium”이다). 앞에서 언급한 오류들이 편집 중에 잡히지 않은 점도 옥의 티이다.
오스만 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마틴 래디 선생님의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는 부러운 존재다. 합스부르크조의 역사를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이만큼 좋은 시작점이 있을까 싶다. 앞서 오가사와라 선생님의 ⟪오스만 제국⟫나 과거 번역되어 소개된 도널드 쿼터트 교수님의 ⟪오스만 제국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오가사와라 선생님의 책은 분량이 너무 적고, 도널드 쿼터트 교수님의 책은 오스만 제국의 역사 후반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흐름을 타고 좀 더 쉽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책이 나오길 바란다.
* 본 서평은 부흥 카페 서평 이벤트에 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야 샤힌, 『술탄 쉴레이만의 삶과 시대』 (0) | 2023.03.18 |
|---|---|
| 마리 파브로, 『말 위의 개척자, 황금 천막의 제국』 (0) | 2023.03.02 |
| 제러미 블랙, 『거의 모든 전쟁의 역사』 (1) | 2022.07.08 |
| 미야자키 이치사다, 『중국중세사』 (0) | 2022.01.18 |
| 이근명, 『왕안석 평전』 (0) | 2021.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