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 Michael. 2016. Power, Politics, and Tradition in the Mongol Empire and the Īlkhānate of Iran. Oxford University Press. xii+238 Pages. £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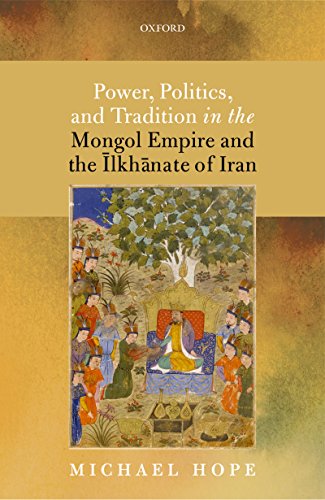
훌레구 울루스, 속칭 일칸국에 대해 많은 글을 읽지 않아 몰랐었는데, 아주 최근까지 훌레구 울루스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정리한 연구서가 영어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조지 레인(George E. Lane)의 Early Mongol Rule in Thirteenth-Century Iran: A Persian Renaissance (Routledge, 2003)도 나왔고 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가 꽤 충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다. 찾아보니 훌레구 울루스의 정치사에 대한 학계의 표준적인 서술은 1968년 케임브리지 이란사 5권의 일부로 보일(J. A. Boyle) 교수가 기고한 “Dynastic and political history of the Il-Khans”이 최선이었다고 한다.
의아하게 느껴지는 이 부재를 채워준 것이 마이클 호프(Michel Hope)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저서, Power, politics, and tradition in the Mongol Empire and the Īlkhānate of Iran이다. 책의 존재 자체는 academia.edu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주엽 선생님께서 한국에도 훌레구 울루스를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고 소개해주셔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 마이클 호프 교수가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학부에 재직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찾아보게 된 이 책을 읽는 시간은 꽤 즐거운 것이었다. 마이클 호프 교수는 몽골 제국사 초기와 훌레구 울루스의 정치적 권위에 대해 신선한, 그러면서도 썩 설득력있는 주장을 기반으로 훌레구 울루스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이다. 책은 여는글과 닫는글을 포함하여 6개 장으로 구성되는데, 이 순서에 따라 간략히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여는글은 세 개의 꼭지로 구성된다. 첫번째 꼭지는 책의 전반적인 시각을 설명한 부분이다. 마이클 호프 교수는 칭기스 칸이 죽은 뒤 칭기스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를 두고 크게 두 가지 입장이 대두되었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칭기스 혈족 이외의 장군, 왕비, 군소 왕공 등 귀족들의 입장으로, 몽골 제국은 모두의 공동 재산임으로 쿠릴타이와 같은 합의 체제를 통해 정국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저자는 이를 합의파(collegial)라 묶었다. 둘째 입장은 뭉케 카안을 위시로 한 톨루이 왕가에서 주장한 관념으로, 칭기스의 카리스마는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며, 몽골 제국은 칭기스 혈족의 가산이라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를 세습파(patrimonialist)라 불렀다. 그 다음 꼭지는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사료들에 대한 소개였다.
마지막 꼭지는 칭기스 칸의 경력에 대한 간략한 정리이다. 호프 교수는 한국에도 소개된 라츠네프스키의 『칭기스 칸』 등 다양한 연구를 활용, 칭기스가 과거의 귀족층을 자신의 혈족과 추종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귀족층으로 대체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칭기스는 일종의 천명을 받았다는 관념을 혁명의 기반으로 삼았는데, 칭기스가 죽은 뒤에는 칭기스가 받은 이 천명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가 문제로 남게되었다.
2장 “The Problem of Succession (1227-59)”는 뭉케 카안의 즉위를 기점으로 두 꼭지로 나누어졌다. 우선 호프 교수는 칭기스 사후에는 합의파의 세력이 강했다고 보았다. 쿠릴타이를 통해 우구데이가 즉위하고, 우구데이는 칭기스 칸의 관슴(yosun)과 법(jasaq)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칭기스가 가족과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준 재산과 지위, 이해를 모두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를 호프 교수는 초창기 몽골 제국이 단순 황금씨족(altan uruq), 특히 칭기스의 네 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아카나르(aqa-nar: aqa는 몽골어로 ‘형’을 뜻하며, nar는 복수표지이다)들이 함께 꾸려가는 집단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한 것이다. 우구데이의 뒤를 이은 구육 역시 쿠릴타이를 통해 즉위한 뒤 전임군주들의 관습과 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통해 이 전통을 이어갔다.
그러나 뭉케의 카안 즉위로 이와 같은 ‘합의파’는 큰 위기를 맞이했다. 뭉케는 쿠릴타이가 아니라 쿠데타로 집권했고, 그의 즉위는 아카나르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를 지지한 것은 조치 일문과 톨루이 일문, 그리고 관리 일부가 전부였다. 따라서 뭉케로서는 ‘합의파’ 체제를 버리고 ‘세습파’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뭉케는 차가타이 일문과 우구데이 일문, 그리고 우구데이와 구육에게 등용된 관리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는 한편, 칭기스의 카리스마는 전적으로 칭기스의 후예들에 한정되며, 몽골 제국은 철저히 칭기스 가문의 가산이라는 논리를 펴나간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몽골 제국의 아카나르를 하나로 묶어주던 구심력은 파멸을 맞이했고, 그의 사후 계승분쟁을 통해 각 울루스가 분열되는 구실이 되었다.
3장 “Hülegü and the Īlkhānate” 역시 두 꼭지로 나뉜다. 첫꼭지는 훌레구가 처음 이란 방면으로 파견되어 훌레구 울루스를 세우는 내용을 다룬다. 호프 교수는 이 부분에서 여러 노얀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훌레구의 서정군에서 톨루이 일문의 군대는 소수였고, 조치 일문과 차가타이 일문, 우구데이 일문의 병력과 우구데이 정권 시기 이란 방면에 파견된 탐마군이 주력이었다. 반면 훌레구의 지위는 공식적으로는 서정군 사령관이었다는 것이고, 그나마도 다른 칭기스조 왕자들의 도전을 받을 정도로 권위가 약했다. 따라서 훌레구는 뭉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 조치 일문의 군대를 소외시키면서 다른 세력들을 포섭, 독자 정권 수립에 나섰다. 따라서 훌레구 울루스는 다른 어떤 울루스들보다 합의파의 입김이 강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 한계는 아바카와 아흐마드 테구데르의 재위에 더욱 강화되었다. 아바카는 강렬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나, 이 시기에는 조치 울루스와 차가타이 울루스의 침공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노얀들에 협조를 구걸할 수 밖에 없었다. 아흐마드 테구데르의 경우 무슬림이었다는 한계 때문에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기 힘들었고, 이 점 덕분에 아카나르들의 간택을 받아 아바카 사후 일칸으로 즉위하게 된다. 그러나 테구데르는 집권 후 주와이니 가문을 중용하는 등 노얀들의 이해를 침해했고, 그 결과 몽골 제국 최초의 국왕시해 피해자가 되는 최후를 맞이했다.
4장 “The Patrimonialist Revival and the Fight for Political Primacy (1284-1304)”은 테구데르 사후 아르군의 즉위부터 시작한다. 아르군의 즉위는 사실 테구데르의 예기치 못한 살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아르군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한 성채에 포위된 상태로, 테구데르가 폐위당하지 않았다면 사형당했을 운명이었다. 따라서 테구데르 살해를 주도한 부카카 아르군 즉위 직후 모든 실권을 쥐었다. 그러나 아르군은 조심스럽게 힘을 모아 부카를 타도한 뒤 노얀들의 세력을 무자비하게 찍어누르며 큰할아버지 뭉케의 뒤를 따랐다.
뭉케의 재위가 그러했듯, 아르군의 재위 역시 훌레구 울루스의 분열을 낳았다. 아르군 사후 게이하투가 일칸의 자리를 주장했을때 그는 자신의 임지인 룸의 노얀들의 지지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라크 지방의 노얀들은 상황을 관망하다가 룸 지방의 반란으로 게이하투 정권이 위기에 빠지자 재빠르게 반기를 들어 바이두를 일칸으로 옹립했다. 그동안 더 동쪽의 후라산에서는 나우루즈가 이슬람을 받아들여 칭기스조 전통과 이슬람 전통을 융합해 새로운 정권 형성 준비에 매진하고 있었다. 나우루즈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던 아르군의 아들, 가잔 왕자와 협조하여 바이두를 몰아내고 훌레구 울루스를 장악한다.
가잔은 즉위 직후부터 노얀들의 권력 약화를 위해 노력했다. 우선 이슬람 개종을 통해 무슬림 노얀들의 지지세를 규합했고, 노얀들을 승진시키되 그 임지를 본래의 영지에서 먼곳으로 배정하여 힘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다양한 개혁 정책을 입안하며 노얀들의 권력을 거세하려 노력했다. 한편으로는 뭉케와 마찬가지로 칭기스조의 세습 카리스마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슬람적 요소를 대거 차용했다. 그는 칭기스를 무함마드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로 올리고, 자신은 알리와 영적인 접촉을 통해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선전을 주로 펴냈다. 이 과정에서 칭기스 가문은 이슬람 세계에서 무함마드 가문, 그 이상의 명예를 지닌 존재가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5장 “Amirate or Sultanate: The Chinggisid”는 가잔 사후의 훌레구 울루스를 다루었다. 가잔은 정권을 운용하며 자신의 혈족을 중앙 정치에서 배제했다. 게다가 울제이투는 가잔 생전에 정치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며 권위를 거의 지니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울제이투는 일칸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 가잔의 옛 동지들을 그대로 인정해줘야만 했고, 이렇게 가잔의 추종자들은, 이제 아미르라 불리며 옛 노얀들과 같은 기득권층이 되었다. 울제이투 정권은 외견상 가잔의 절대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실제로는 가잔의 추종자들이 주도하는 군사귀족 정권이었다. 이 경향은 울제이투가 죽고 12살의 어린 아부사이드가 집권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아부사이드는 사실상 꼭두각시 칸으로, 반란을 일으킨 노얀을 처벌할 힘조자 가지지 못했다.
아부사이드가 죽자 이제 각지의 아미르들은 아예 각자 꼭두각시 칸을 세우고 독립정권을 운영했다. 그러다 기어코는 꼭두각시 칸마저 세우지 않으며 훌레구 울루스는 끝이나게 된다. 그러나 일칸들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남아있었는데, 테무르조의 발흥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 테무르의 아들이자 후계자 샤루흐는 훌레구 울루스 동부의 중심지 헤라트를 기반으로 가잔이 시작한 몽골-이슬람 정치권위의 융합 정책을 이어갔다. 비록 테무르 가문이 카라추 출신이라 뭉케나 가잔과 같은 절대주의 정권을 운영하지는 못했으나, 일칸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이 유산을 이어나간 결과 이는 이후 동부 이슬람 세계 국가들의 전범이 되었다.
이상 논의를 통해 마이클 호프 교수는 초기 몽골 제국과 훌레구 울루스의 역사에서 크게 2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가잔과 군사귀족층의 갈등은 가잔의 시대에 대뜸 탄생한 것이 아니라, 칭기스가 죽은 직후 시작된, 칭기스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두 이데올로기의 경쟁이 연장된 것이었다. 이런 면을 고려하면 가잔 시대와 그 이후 훌레구 울루스에서 벌어진 문제를 종래의 해석과 같이 몽골 문화와 이슬람 문화 또는 페르시아 관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파와 몽골 귀족의 분권파의 갈등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진다. 과거의 연구들은 몽골인들이 이란 지역에서 다수인 페르시아 인구(또는 튀르크 인구)에 동화되었다고 여기나, 실제로는 칭기스 가문을 중심으로 한 몽골식 정치 문화는 동부 이슬람 세계에서 훌레구 가문의 몰락 이후로도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호프 교수는 철저히 원사료를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앞선 연구들의 한계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냈다. 그러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칸과 카안 등 용어의 문제를 보자. 저자는 51쪽에서 칭기스와 부르테 사이에서 태어난 네 아들이 모두 칸이었기 때문에 우구데이가 카안이라는 칭호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호동 교수께서 지적하였듯, 칭기스 일족의 제왕들 가운데 이름 뒤에 칸 칭호가 붙여진 경우는 사후에 일종의 존칭으로 붙여진 것이지, 실제로 생전에 칸을 칭한 것이 아니다. 몽골 제국 서방 삼왕가의 군주들이 스스로 칸을 칭한 것은 126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표현하기 위함이었고, 제국 전체의 군주인 대칸은 그런 칭호를 부여하거나 인정하지도 않았고, 왕가들 간의 상호 관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였다. (2016: 7-12) 또한 저자는 본문 93-94쪽에서 일칸이 ‘복속된 칸’을 뜻하며 훌레구 울루스에서만 사용되었다고 적었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 (김호동, 2016: 12-15; 논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저자인 호프 교수도 2017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 시각은 버린 것 같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103쪽에서 아릭부케의 쿠릴타이가 쿠빌라이의 쿠릴타이에 선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는 라시두딘의 『집사』의 서술이고, 『원사』의 내용을 고려하면 쿠빌라이의 개평 쿠릴타이가 1260년 5월 5일에 개최되었고, 아릭부케는 그 직후인 6월에 카라코룸에서 쿠릴타이를 열었다고 보는 쪽이 좀 더 합당하다. (김호동, 2007:15-17)
그러나 이는 사소한 단점이고, 저자의 해석을 중대하게 약화시키지 않는다. 호프 교수가 선보인 새로운 해석들은 대체로 몽골이냐 이슬람이냐, 정주냐 유목이냐 하는 등 도식화된 설명을 대체하기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최근 권용철 선생께서 적은 『원대 중후기 정치사 연구』(온샘, 2019)를 읽으면서 카라추 계층에 초점을 맞춘 몽골 제국사 연구를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꽤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최신 저작을 나름 일찍 읽은 스스로가 대견해질 정도이다. 기회가 된다면 마이클 호프 교수의 강의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
참고문헌
김호동. 2007. 『몽골제국과 고려』.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호동. 2016. “울루스인가 칸국인가: 몽골제국의 카안과 칸 칭호의 분석을 중심으로.” 『中央 아시아 硏究』 第21號 第2卷: 1-29.
관련도서
찰스 핼퍼린,『킵차크 칸국: 중세 러시아를 강타한 몽골의 충격』, 권용철 옮김.
티모시 메이, 『칭기스의 교환: 몽골 제국과 세계화의 시작』, 권용철 옮김
이주엽, Qazaqlïq, or Ambitious Brigandage, and the Formation of the Qazaqs
데이비드 모건, Medieval Persia 1040-1797, 2nd ed.
A.C.S. Peacock, The Great Seljuk Empire
Douglas E. Streusand, Islamic Gunpowder Empires
Stephen F. Dale, The Muslim Empires of the Ottomans, Safavids, and Mughals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터 골든, 『중앙아시아사: 볼가강에서 몽골까지』 (0) | 2021.02.21 |
|---|---|
| 유승훈, 『부산의 탄생』 (0) | 2020.12.28 |
| 테일러, 『지도와 사진으로 보는 제1차 세계대전』 (0) | 2020.10.12 |
| 김인희 편, 『움직이는 국가, 거란』 (0) | 2020.10.08 |
| 데이비드 모건, Medieval Persia 1040-1797, 2nd ed. (0) | 2020.09.20 |



